[시니어 오피니언] 2018년 인구절벽과 고령사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입력 : 2017.08.14 17:05
정부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부터 10여 년 간 10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인구절벽’과 ‘고령사회’의 두 가지 사회현상을 동시에 맞게 된다.
7월 30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출생아 수를 36만 명대로 하락을 예측하여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대를 유지해 오던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어 인구학자들 사이에 한 해 출생아 수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30만 명대의 첫 진입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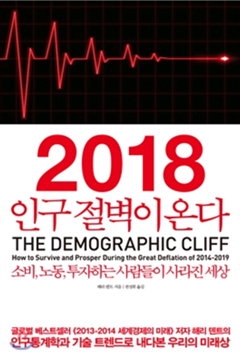
이러한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위기를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2018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다음 세대의 소비 주역이 나타날 때까지 경제는 아찔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인구 절벽'이라 명명했다. 그 불가피한 불황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부터 시작된다.
‘인구절벽’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 대대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해리 덴트는 2015년 10월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절벽의 해결 방안으로 이민 촉진과 출산·육아 장려책을 제시한 바 있다. 통계청의 발표로는 한국은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은 오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의 고령층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18년 14.2%로 상승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분류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18년 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미국·독일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각각 73년, 40년이 소요되었고 초고령사회인 일본조차도 24년이 소요된 것을 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감할 수 있다.
‘인구절벽’과 ‘고령사회’ 같은 인구변화의 중요성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지만 일반적인 사회변화와 다른 점은 인구변화는 상당 부분 이미 발생했거나 변화양상을 예측하기 쉬우므로 미래의 인구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여 감당하지 못할 사회문제에 휩싸이지 않도록 인구변화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7월 30일 보건복지부의 발표로는 정부는 앞으로 5년의 임기 기간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과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100조 원을 투입했어도 효과가 없었다고 하니 정부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협조 등이 포함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인구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본다. 2018년 ‘인구절벽’과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실효성 있는 강력한 해결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