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오피니언] 초고령화 사회에 예상되는 부동산자산시장 변화
입력 : 2018.05.02 16:33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8년 후인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고 한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해 본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동산자산시장의 핵심변수는 경제성장률, 소득과 관련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인구구조 변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에 출생한 세대)의 실질적인 은퇴 등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지속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은퇴하여, 부동산 구매력을 갖춘 유효수요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되거나 하락이 예상된다.
최근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헤리덴터는 그의 저서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인구절벽‘ 개념을 제시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하고 한국이 2018년 인구절벽에 직면하여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영국의 인구학자 폴 윌리스는 인구지진(age-quake)이란 용어로 고령사회 충격을 지진(earthquake)에 비유하며, 인구지진은 일반지진 보다 훨씬 파괴력이 강하며 그 강도가 리히터 규모 9.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께 세계 경제는 인구지진으로 뿌리째 흔들리며 한국도 피해를 크게 입는 국가 중 하나로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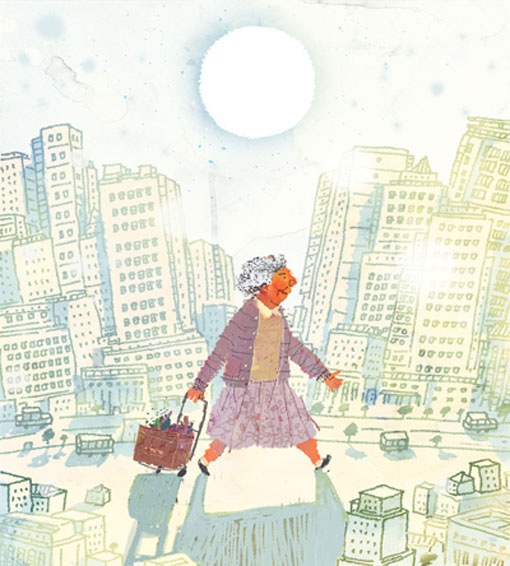
고령사회가 진척되면 될수록 소득 감소가 커지게 된다. 폭발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부족한 소득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산매각을 초래하게 되어 종국에는 주택수요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부동산 수요 감소는 부동산버블붕괴에 버금가는 자산 가격 하락에 직면하게 한다는 것이 '자산붕괴가설'의 주장이다.
이를 신조어로 만들어 낸 것이 '인구지진(age-quake)'이라는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강진'이며,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줄 구매력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부동산에 대한 자산 가치 하락이 급격히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부동산자산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대비해야 하는가?
초고령화 사회는 부동산 자산가치를 안정화하거나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소득이 줄어들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의 비중을 줄여나갈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생활에 꼭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미리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여 매월 현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는 부동산자산 가치의 상승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는 1인 가구 급증과 노인주택의 급증으로 주택은 소형이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15년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27% 이상으로 혼인 기피 현상, 이혼과 사별 등으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중대형 주택보다는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므로 중대형 주택을 처분하고 중소형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초고령화 사회에서 1인 가구 비율 증가는 매월 연금과 같이 현금을 가져다주는 수익형 부동산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취업을 못해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을 피하는 젊은 층을 위한 원룸, 셰어하우스, 소형오피스텔 등의 수요가 많을 것이며 급증하고 있는 노령인구들의 사별로 인한 나 홀로 노인들을 위한 소형 노인주택과 유료임대주택 등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는 예전에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되었던 시대는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부동산이 안정되거나 하락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자산을 7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조정하여 환금성이 높고 연금과 같이 매월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소형수익성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