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에세이] 말보다 글
입력 : 2020.10.29 17:54
대한민국에서 ‘카카오톡’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회사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팀장이 팀원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 거의 구두로 했었는데 이젠 구두보다 메신저를 통하는 지시가 일상화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코로나이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올 2월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바야흐로 언택트 시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코로나의 주요 발병 요인이 사람과의 접촉이어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렵게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회사 생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구두로 업무 지시를 하게 되면 침방울로 인해 감염의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의사전달의 정확성이다. 사실 일상의 대화에선 무심코 던진 말이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인이 얘기하고도 때론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다. 특히 종종 TV에서 하는 청문회를 보면 피감사자의 경우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일부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필자 또한 종종 본인이 했던 말인지 혼동할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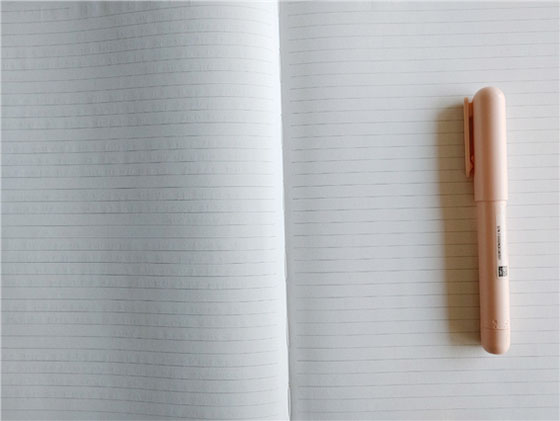
그러나 메신저에 적혀진 글은 본인의 의도에 의해 지우지 않는 한 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내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점검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카카오톡의 가장 큰 장점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확장성이다. 보통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내 생각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얘길 하기가 쉽지 않다. 정치인 지망생이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카카오톡에선 다수에게 쉽고 빠르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작게는 두, 세 명 많게는 수백 명과 같이 하는 단톡방에서 생각을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말보다 글이란 주제로 정리하면서 글의 중요성에 대해 카카오톡을 예로 들었다. 글을 적는 방법은 카카오톡 외 다른 많은 메신저 도구들이 있음을 참조해도 좋을 듯하다. 말이란 종속적인 부분이 있고 글은 독립적인 부분이 있다. 말은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하기에 혼자서는 의미가 없다. 그에 반해 글은 상대가 필요치 않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나 혼자서 적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말에 얽힌 옛 속담이 생각난다. “말 한마디로 흥하고 말 한마디로 망한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가 대표적이다. 옛 조상들이 그 당시에도 말의 중요성을 이미 깨달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속담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말의 속성을 약간 엿볼 수 있다. 즉, 말이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쉽게 주워 담을 수 없다. 내가 한 말에 대해 번복하기가 힘들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가 옛 속담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글은 말에 대해 한 번 더 검증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자 할 때 글을 적고 나서 한 번 더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즉, 내가 적은 글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나 민감한 내용은 수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수정 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여러 가지 실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신 위의 예처럼 글은 몇 번의 검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하는 이치로 해석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몇 분 더 갈려다 몇십 년을 먼저 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필자 입장에선 좀 느리더라도 말보다 글로써 가능한 사람들과 소통했으면 한다. 검증 없이 뱉은 말로 갈등을 일으키니 차라리 글로써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